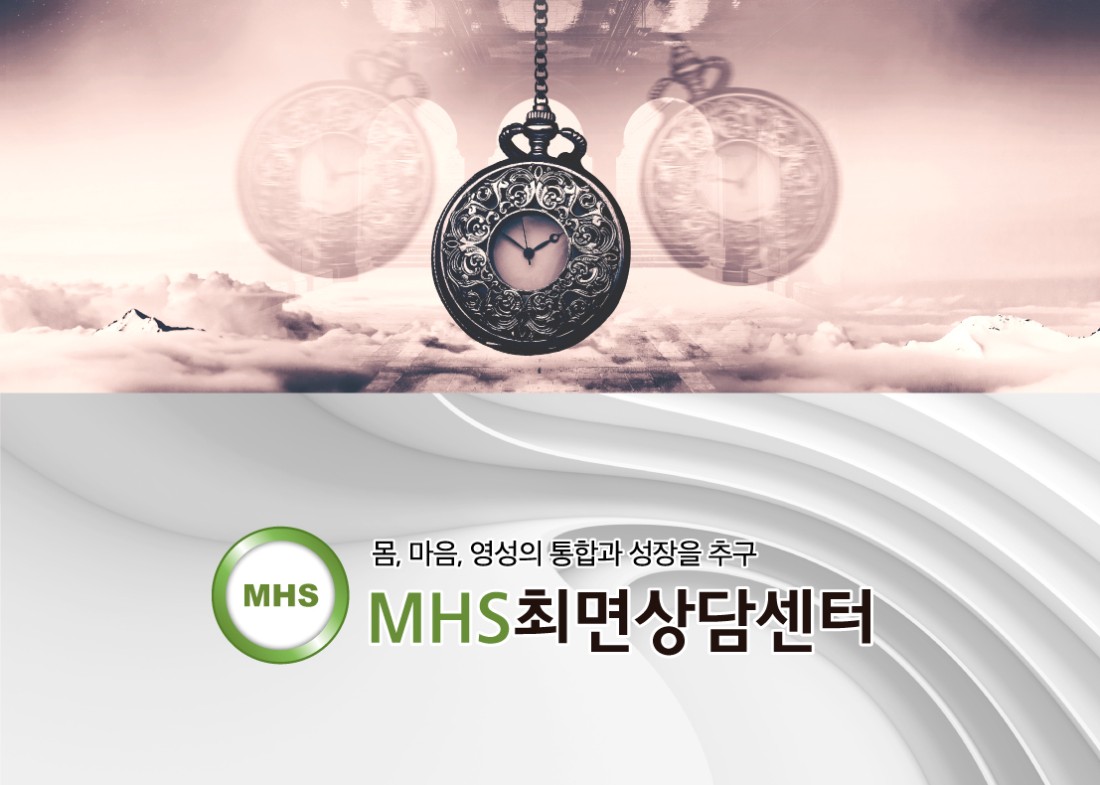최면의 세계
1. 최면 (Hypnosis) 이란 무엇인가??
최면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적 휴식상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휴식상태와는 분명히 다르며, ┎잠┒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최면을 의학적으로는 의도된 무의식 상태를 최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무의식이라고 해서 휴식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최면이란 일정한 암시조작에 의하여 암시에 걸려 있는 상태, 즉 피 암시성이 높은 상태로 이끄는 방법입니다. "최면에 들어가면 외관상으로는 잠자는 것 같이 보이지만 수면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독특한 상태가 됩니다."
수면상태는 정신이 완전히 주위로부터 고립되며 최면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고립될 뿐입니다. 즉, 수면 상태는 외부와 차단되게 방문을 완전히 닫아 놓은 상태라면 최면 상태는 외부 즉 최면자만을 접할 수 있게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식 활동이 감퇴되고 무의식(잠재의식)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순전한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를 최면성 트랜스(Hypnotic Trance)라고 말합니다. 이 트랜스에는 자발적 의지 운동이 감퇴되어 거의 수면에 가까운 상태에서부터 각성시와 같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상태, 혹은 양자가 혼합한 경우 등 여러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피 암시성이 대단히 높아져서 운동감각, 지각, 기억, 감정 등이 각성 시와는 아주 달리 기발한 형태를 나타나게 되며, 비활성화된 잠재능력을 일깨워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이 특유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 갖가지 암시조작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최면유도법 또는 최면이라고 합니다.
최면상태란 최면을 받는 특정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현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떤 대상에 주의를 강하게 집중시키면 의식이 협착되고 잠재의식이 도출되어 최면상태가 출현한다는 원리를 알고 보면 최면은 신비적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무엇인가에 주의가 고도로 집중되어 푹 빠져 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즉, 재미있는 오락이나 흥미있는 강연을 듣는다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는 중에, 혹은 당신이 좋아하던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주의가 어떤 하나의 대상에 극단적으로 집중되어 버렸다면 이미 일종의 최면상태를 경험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자연 최면상태"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최면과는 구별되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 나오는 자연최면은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최면에서처럼 최면상태를 유지해서 잠재의식에 유용한 암시를 주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등의 일은 할 수 없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2. 최면 (Hypnosis)의 종류
◎ 타인최면
최면가가 내담자를 치료하는 모든 최면을 타인최면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정신과, 심리치료분야가 여기에 해당되며,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돕거나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부인과 산모들이 최면치료를 통해 무통분만을 하거나 고혈압, 당뇨병등의 난치병과 각종 심인성 질환 치료에 많이 이용됩니다.
◎ 자기최면
최면기법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간단하게 할 수 있으나,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과 일정범위 이상의 최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최면을 위해서는 최면전문가나 권위자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비디오테이프나 씨디, 그림책 등의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무대최면
방송프로그램에서 최면사가 나와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일종의 최면 Show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마술사가 Show를 하듯 최면의 신비함을 보여주어 흥미와 즐거움을 관객에세 선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대최면은 무의식 세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정신세계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최면은 제한된 시간에 무대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면의 신비화와 같은 오해와 선입견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최면의 본질을 알리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3. 현대 최면 (Hypnosis)의 역사
최면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과 유럽 등지의 의학계와 심리학계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었고, 영국에서는 1955년, 미국에서는 1958년 각각 치료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1960년에는 미국 심리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전통적 최면의 역사는 5천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현대적 의미의 최면은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메즈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프로이트의 최면연구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는 당대 세계 최고의 최면 전문가였던 프랑스의 신경생리학자 샤르꼬로부터 최면을 배운 후 최면 연구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타르시스라고 불리는 감정정화법의 치료적 가치, 무의식의 존재와 그것의 병리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최면을 버리고 정신분석 위주의 심리치료의 선구자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면에 능숙하지 못했거나 치료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등등 성이 분분합니다.
2> 헐의 최면과학 성립
헐은 미국 예일 대학 심리학 교수였는데 1930년대 초부터 최면에 대하나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0여년간 최면에 대한 실험을 전개하여 최면과학 성립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표준화되고 객관적인 실험절차에 의한 최면실험 전통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3> 힐가드의 최면
1949년 미국심리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서 탁월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는 1957년 정신과의사인 부인 조세핀과 최면연구에 몰두해 수백편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였습니다.
4> 에릭슨의 NLP
헐의 제자이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최면은 일명 간접최면법 (Indirectve hypnosis)로 알려지면서 직접적이며 지시적인 전통적 최면과는 대조적인 한 분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의 접근은 주로 제자인 헤일리 (Jay Heley)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 그룹 (Palo Alto Group), 의사소통 이론을 중심으로 한 가족치료, 전략적 치료 (Stratege thrapy)와 해결중심 (Solution Orientation) 치료분야에 계승되었습니다. 에릭슨 이론은 구니슨 (Gunnison 1985, 1990)과 오타니 (Otani, 1989)등이 심리치료의 원리와 기법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은 밴들러와 그라인더의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즉 NLP 체계의 기초가 되기도 하여 NLP가 성립하고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